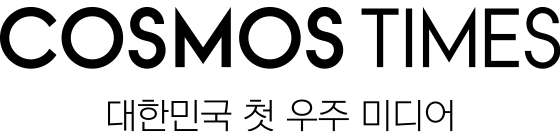지난 14일 오후8시54분(한국시간) 우주파편 한 개가 빠른 속력으로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다가왔다. ISS에 도킹해 있던 러시아우주국(Roscosmos)의 프로그레스 MS-22 화물 캡슐은 급히 추력기를 135초간 가동했고, 1500억 달러짜리 ISS는 지상 419㎞의 고도로 올라갔다. ISS가 이렇게 한번 회피 기동하면 약 100만 달러(13억원)의 비용이 든다. MS-22 캡슐은 지난 6일 아르헨티나의 지구관찰 위성 하나가 접근할 때에도 6분 이상 추력기를 가동해, ISS의 고도를 1.2㎞ 올렸다. 1999년 이래 ISS가 우주파편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기동한 회수는 32차례에 달한다.

현재 지구에서 가까운 궤도에는 정상 가동 중인 위성들 외에도, 로켓 잔해물, 고장 난 위성들, 우주인들이 우주유영 중에 놓친 볼트와 너트, 드라이버, 벗겨진 페인트 조각, 수많은 금속 조각들이 함께 돌고 있다.

우주는 광활하지만, 대부분의 위성과 우주파편은 지표면에서 1000㎞ 고도 내에서 지구를 돈다. 이 중에서도 수많은 우주파편과 방치된 물체들이 쌓여 있어 특히 ‘나쁜 동네’는 고도 950~1050㎞ 구간이다. 작년 6~9월에만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비껴간 사례가 1400건이나 발생했다. 이 우주파편은 계속 방치되면 위성ㆍ우주선들의 운행과 우주 개발 프로젝트에 더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따라, 우주파편을 감시ㆍ제거하는 우주산업 분야도 계속 커진다. 작년 9월의 포천(Fortune) 비즈니스 인사이츠는 “2029년까지 우주파편 시장 규모가 15억27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분석기관은 궤도 내에서(in-orbit) 기존 위성을 수리ㆍ복구하는 서비스 시장까지 합치면 2031년까지 우주파편 관리 시장은 143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지난 10일 미 항공우주국(NASA)는 매우 ‘이례적인’ 보고서를 냈다. NASA의 기술ㆍ정책ㆍ전략실은 우주파편을 제거ㆍ청소하기 위해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해 배치하는 비용과, 지금처럼 필요할 때마다 회피 기동하는 비용을 비교했다. 보고서의 결론은 뜻밖이었다. 최소한 금세기 중에는 지금처럼 피하는 게 막대한 개발비를 들여 우주 대청소에 나서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힌다는 것이었다.
미국서 우주파편 피하기 위한 연간 비용 754억원에 불과
NASA 보고서는 우주파편과의 잠재적인 충돌 비용이 워낙 커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라도 우주 청소에 필요한 신기술을 개발해 배치하는 것이 나은지를 비교하는 기회-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했다. NASA는 가장 우려스러운 덩치가 큰 50개의 우주 파편을 1차 제거 대상으로 삼는 방안과, 450~850㎞ 고도에 몰려 있는 1~10㎝ 크기의 지상에선 추적도 안 되는 파편 10만 개를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우주파편을 제거ㆍ청소 방식은 예인(tug)하거나, 금속판에 파편을 충돌시켜(sweeper) 속력을 떨어뜨리는 방식, 지상에서 레이저를 쏴서 파편을 슬쩍 밀어내는(nudge) 방식, 우주파편을 다른 위성의 추진제로 재활용하는 방식 등 다양했다. NASA가 비교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신기술은 개발해 적용하기까지 비용이 막대해 손익분기점을 맞추기까지 수십년이 걸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체 위성의 63%(작년 4월30일 기준)를 운영하는 미국의 위성운영사들이 우주파편을 피하기 위해 매년 쓰는 경비는 5823만 달러(약 754억원)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5억 달러짜리 주문 제작하는 상업 위성을 한 번 충돌 회피 기동하는데 드는 비용은 인건비 462달러를 포함해 699달러(약 90만5000원)였다. 지상 통제소에서 수많은 우주파편을 모니터하면서 충돌 가능성을 예측해 이를 피하는 기술이 이미 매우 발달했다는 얘기였다.
실제로 막대한 피해 야기하는 충돌 드물어
우주파편이 수백억 달러를 들여 구축한 광대역 인터넷 통신 위성과 군사 첩보위성, 기상 관찰 위성 등에 얼마나 위협적인지는 많이 보도됐다. 최초의 우주파편은 1957년 10월 최초의 인공위성이었던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였다. 발사 3주 뒤 배터리가 고갈되면서 우주파편이 됐다. 이후 종종 충돌이 발생했다. 2009년 2월19일 용도 폐기된 러시아 통신위성 코스모스 2251호가 시베리아 상공 약 800㎞ 고도에서 미국의 이리듐 위성과 3만6000㎞의 속도로 충돌했을 때에는 크기 10㎝ 이상의 파편만 2000개 이상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후로는 추적·회피 기술의 발달로 이렇게 파괴적인 충돌은 매우 드물었다. 약 600개의 군집위성을 보유한 원웹(One Web)의 경우, 하루 평균 6~8번의 회피 기동을 한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충돌은 겪지 않았다.
우주 예인선 개발에 60억 달러, 손익분기점 맞추기까지 최대 94년 소요
충돌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50개의 대형 우주파편이 실제로 위성이나 우주선과 충돌할 가능성은 연간 0.03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피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저렴하다면, 환상적으로는 보이지만 증명되지도 않은 신기술 개발에 막대한 돈을 들이는 것은 합리화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영국의 스카이로라(Skyrora)가 개발하는 우주 예인선(space-tug)은 개발비가 60억 달러나 든다. kg당 파편 제거 비용은 최대 6만 달러. 청소를 마치기까지 156억 달러가 든다. 손익분기점은 최대 94년. ㎏당 제거 비용을 4000 달러로 낮게 잡아도, 손익분기점에 이르기까지 24년이 걸린다고 NASA는 밝혔다.

또 ‘청소(sweeper) 위성’에 두꺼운 금속판을 매달아 일부러 우주파편들과 부딪힌다는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였다. 철판에 맞은 우주파편은 속력을 잃고 결국 대기권으로 밀려 내려가 연소(燃燒)한다. 2021년의 한 논문은 이런 위성 6개가 저궤도를 10년 정도 훑으면, 우주파편의 96.1%까지 제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NASA 보고서는 “㎏당 발사비용을 500달러로 잡고 스페이스X의 스타십 같은 초(超)중량 발사체로 100톤짜리 금속판을 띄워서 5년간 1~10㎝ 크기의 파편과 충돌한다고 해도, 파편 1개를 제거하는 데 9만 달러에서 90만 달러가 든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발 및 배치 비용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는 거의 100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NASA는 다만, 현재 추적이 안 되는 10㎝ 이하 크기의 파편을 레이저로 밀어내는 기술을 개발해 지상이나 우주에 배치한다면, 이 ‘청소기’는 10년 내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이 레이저 기술이 상대국 위성을 불능화시키는 무기로 둔갑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먼저 우주 국가들 간에 공유돼야 한다.
미국, 용도 폐기된 위성 5년 내 제거 의무화
따라서 NASA는 “최소한 이번 세기에는 파편을 추적하고 회피하는 현재의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 한편, 위성업체들에게 용도가 끝난 위성은 책임지고 궤도에서 제거하거나 대기권에서 연소되도록 하는 의무를 강제화하는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미 미국의 경우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작년 9월에 미국에서 승인이 난 위성이거나 미국 시장에서 서비스를 하는 고도 2000㎞ 이하의 위성들은 용도 폐기 5년 내에 제거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25년이었다. 우주파편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는 글로벌 협약이 맺어진다면, 그 다음 순서는 현재 남아 있는 우주파편들을 제거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에 대해 책임 소재를 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